
#1
저는 산등성이 뒤로 몸을 숨긴 채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마을은 여느 때보다 뜨거워 보였죠.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던 냇물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고요.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풀과 나무도 축 늘어져있네요. 그래도 전 그 모습을 무시하며 물방울들을 더욱 힘껏 붙잡았어요. 흥, 제 도움 없이도 잘 지내는지 두고 보라죠!
저는 구름이에요. 마을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죠. 마당에서 빨래를 너는 아주머니, 밭일에 여념이 없는 아저씨, 온 마을을 쏘다니며 왁자하게 떠드는 아이들, 캉캉 짖는 강아지와 담벼락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고양이…. 그런 평화로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했어요.
제가 산등성이 뒤로 숨어버린 건 한 달 전이었어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 힘겨루기를 하는 통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물방울들을 잔뜩 머금고 있다가 몸이 무거워져 비를 뿌렸어요. 둘의 힘겨루기가 어찌나 팽팽한지 어느 쪽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아 비를 계속 뿌려야 했죠.
궂은 날씨로 마을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저도 구경거리가 없어 심심했어요.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파란 대문 집 옥자 아주머니의 불만 섞인 말소리가 들렸어요.
“어휴, 지긋지긋해. 이 비는 그칠 줄을 모르네.”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은 매우 언짢아 보였어요. 찌푸린 이마에 내려간 입꼬리. 평소 활짝 웃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빨래는 눅눅해서 냄새나지, 쌀독은 습기 차서 곰팡이 피지, 기분까지 가라앉지…. 이제는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마루에서 미나리를 다듬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옆에서 호미 손잡이를 교체하던, 아주머니의 남편 민철 아저씨가 맞장구쳤어요.
“그러게. 농작물이 물러지진 않을지….”
그때 봉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봉석이는 울상을 지으며 신고 있던 신발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줬어요.

“발이 다 젖어서 찝찝해!”
“얼른 양말 벗고 씻으렴.”
아주머니는 툴툴대는 봉석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파란 대문 집 가족의 대화를 들은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내 제 마음속에서도 날카로운 감정이 삐죽삐죽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늘도 만들어주고, 논밭에 물도 주는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담 비를 안 내리는 수밖에.’
저는 넓게 폈던 몸을 웅크려 한곳으로 모았어요. 그러자 맑은 하늘 사이로 태양이 얼굴을 비췄어요. 사람들은 쏟아지는 햇빛을 보며 밝은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길로 산등성이 뒤로 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2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꽉 움켜쥐고 있는 탓에 제 몸은 물방울과 먼지들로 뒤엉켜 무겁고 칙칙해졌어요. 물방울이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단단히 힘을 주고 있다 보니 온몸이 다 뻐근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태양이 말을 걸었어요.
“구름아!”
저는 말할 기분이 아니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태양은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하는 건지 계속 말을 이어갔죠.
“무슨 일 있어? 왜 숨어 있는 거야?”
“누가 숨어 있다고 그래? 움직이기 귀찮은 것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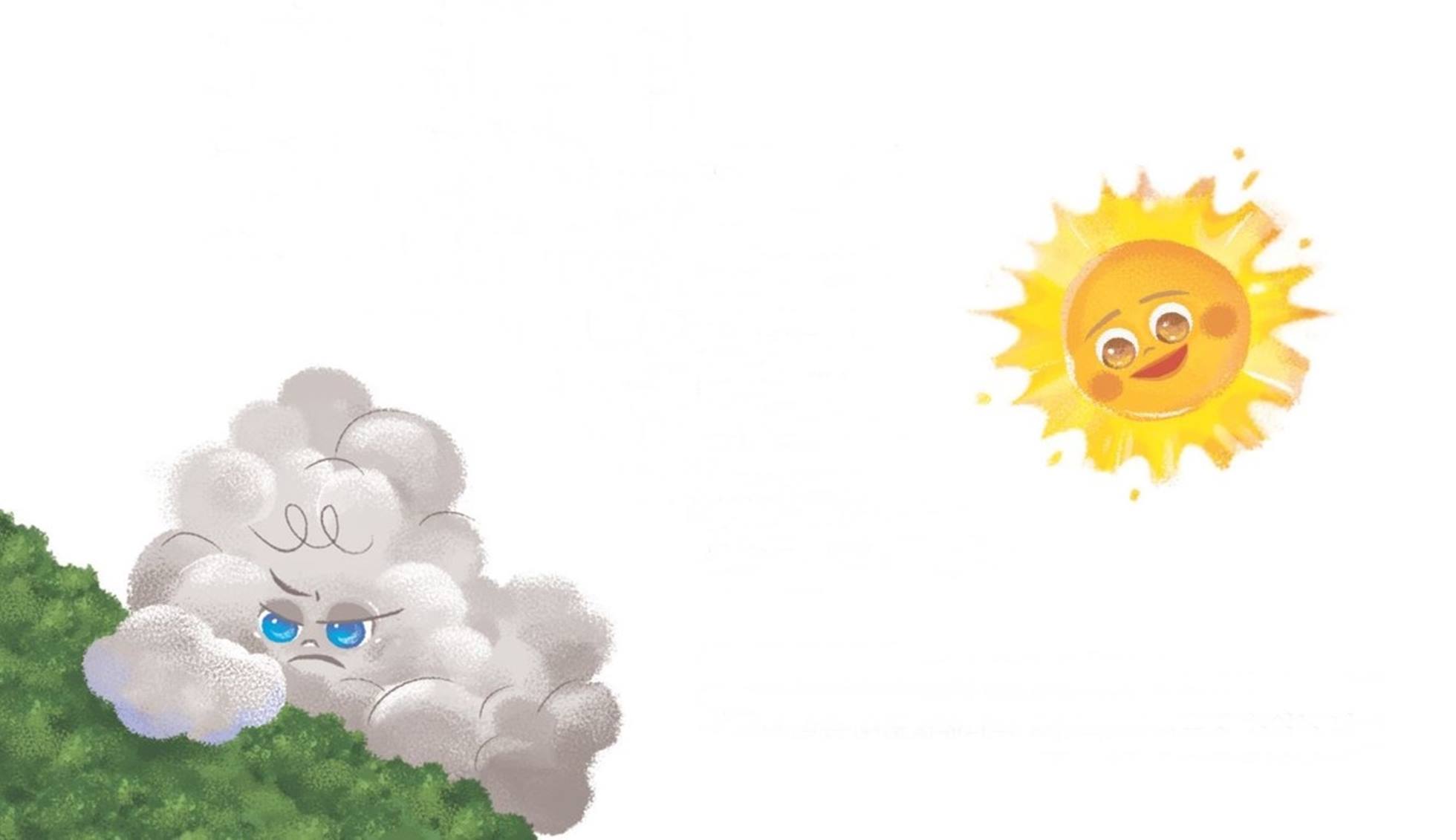
말해 놓고 보니 제 말투가 지나치게 신경질적이었네요. 태양은 그런 제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주며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태양의 배려에 말문이 열린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너도 그런 말 들어 봐. 얼마나 서운하고 배신감 드는지 알아?”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런데 그런 말은 나도 많이 들었어. 특히 구름 네가 없는 날이 계속되면 더워서 못 살겠다고, 가물어서 농사 망치겠다고 원망 섞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데.”
“으응…. 그래?”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되더라고.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농사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구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맑고 화창한 날에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좋은 말도 많이 하니까 가끔 불편한 말을 들어도 이제는 괜찮아.”
전 태양의 말을 가만히 귀담아들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옥자 아주머니와 민철 아저씨의 말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비롯된 순간의 감정일 뿐, 제 마음에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불쾌한 감정을 부풀려 갔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건 오히려 저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스르르 누그러지는 듯했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본 민철 아저씨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풀벌레 우는 소리만 들리던 깊은 밤, 민철 아저씨는 둑길에서 마른 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큰일이네, 비가 내려야 할 텐데. 농사가 안 되면 우리 식구 뭘 먹고 사나….”
아저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우두커니 어둠 속에 서있었어요.
저는 찬찬히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무겁고 칙칙한 먹구름이 되어 물방울들을 고집스레 붙잡고 있는 저를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는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이 물방울들을 그만 놓아줘야겠다고요.
#3
토도독, 토도독.
산등성이를 박차고 나온 저는 온몸을 활짝 펴 마을 전체를 덮고 비를 뿌렸어요. 그러자 서운함과 묵은 감정까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와, 비다!”

“이게 얼마 만에 오는 비야? 단비네요, 단비!”
마른 밭에서 잡초를 뽑던 옥자 아주머니와 민철 아저씨가 내리는 비를 반기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이었죠. 호숫가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던 할아버지도, 땡볕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도 비를 맞으며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시들시들 말라가던 풀과 나무는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지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마음을 열 걸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태양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양은 싱긋 미소를 짓더니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 빗방울 다 쏟아내고 나면 깨워 줘.”
“그래, 좀 쉬어. 내가 산등성이에 있는 동안 계속 열기 뿜어내느라 고생 많았어.”
저는 태양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슬며시 몸을 더 넓혔어요. 비안개가 피어나는 마을이 아름다워 보여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느껴져요.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고, 설레는 듯 간질간질하게 차오르는 것.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아! ‘행복’이라고 할까요?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