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내일 엄마 아빠가 일하러 할머니 댁에 가야 하니까 민후 데리고 집에 좀 있어.”
“싫어요!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단 말이에요.”
“에이, 다음 주에 놀면 되잖니.”
엄마는 부루퉁하게 입술을 내미는 민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민후가 배시시 웃으며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아, 내일 뭐 하고 놀까? 나가서 술래잡기할까? 캐치볼도 하자!”
“너 아직 상처도 다 안 나았잖아. 나가서 또 다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놀아.”
민혁은 민후의 이마에 붙은 반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민후는 반창고를 문지르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영광의 상처지!”
“영광의 상처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쓰냐? 어휴, 됐다.”
민혁은 민후를 노려보던 시선을 자동차 조립 모형으로 옮겨 니퍼로 부품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경쾌한 소리와 함께 깔끔하게 다듬어지는 부품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형아, 그러면 이거 어때? 지금 해보고, 재밌으면 내일 또 하자!”
민후는 침대 밑에 있던 나무 블록을 꺼내 민혁 앞에 내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귀찮아. 너 혼자 해.”
“그러지 말고, 한 번 해보자. 응?”
민후가 민혁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니퍼를 들고 있던 민혁의 손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딱!
민혁은 다급히 부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이드미러 부품의 연결 부분이 잘려 나간 뒤였습니다.
“아 진짜, 다시 붙일 수도 없잖아. 이거 어쩔 거야!”
민혁의 날카로운 눈빛에 민후가 슬금슬금 뒷걸음쳤습니다.
“형아, 미안해. 잘못했어.”
민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민후를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나가!”
민혁은 방문을 세게 닫고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어썼습니다.
#2
다음 날, 늘어지게 잔 민혁은 내리쬐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가니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 시골에 가셨겠거니 했는데, 동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화장실, 베란다, 어디에도 민후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포드닥’ 하고 날갯짓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본 민혁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소파 위에 낯선 새 한 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는 날개를 펼쳤다 접고는 민혁을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서 뛰어내리더니 목을 빳빳이 세운 채로 민혁을 향해 총총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으, 으악! 왜 이래? 저리 가!”
민혁은 손을 휘휘 저으며 새를 쫓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혁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는 구슬처럼 동그랗고 까만 눈에 무지개색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를 찬찬히 살피던 민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민후처럼 이마에 반창고가 붙어 있네. 어, 잠깐…. 설마?’
민혁은 조심스레 동생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미, 민후야?”
순간 새가 고개를 돌려 민혁을 쳐다보았습니다. 민혁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민혁은 얼마 전에 봤던 소설책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사람과 그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혁은 다급하게 인터넷 검색창에 ‘새로 변한 사람’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살피던 중, 한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로 변한 동생 사람으로 돌려놓기.’ 글을 클릭하는 민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글쓴이는 자기 동생이 갑자기 새로 변했다며, 온갖 방법을 시도한 끝에 사람으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글쓴이가 정리한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에게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민혁은 곧장 주방으로 달려가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 불을 켰습니다. 민후가 특히 먹을 때 행복해했기에, 좋아하는 음식으로 기억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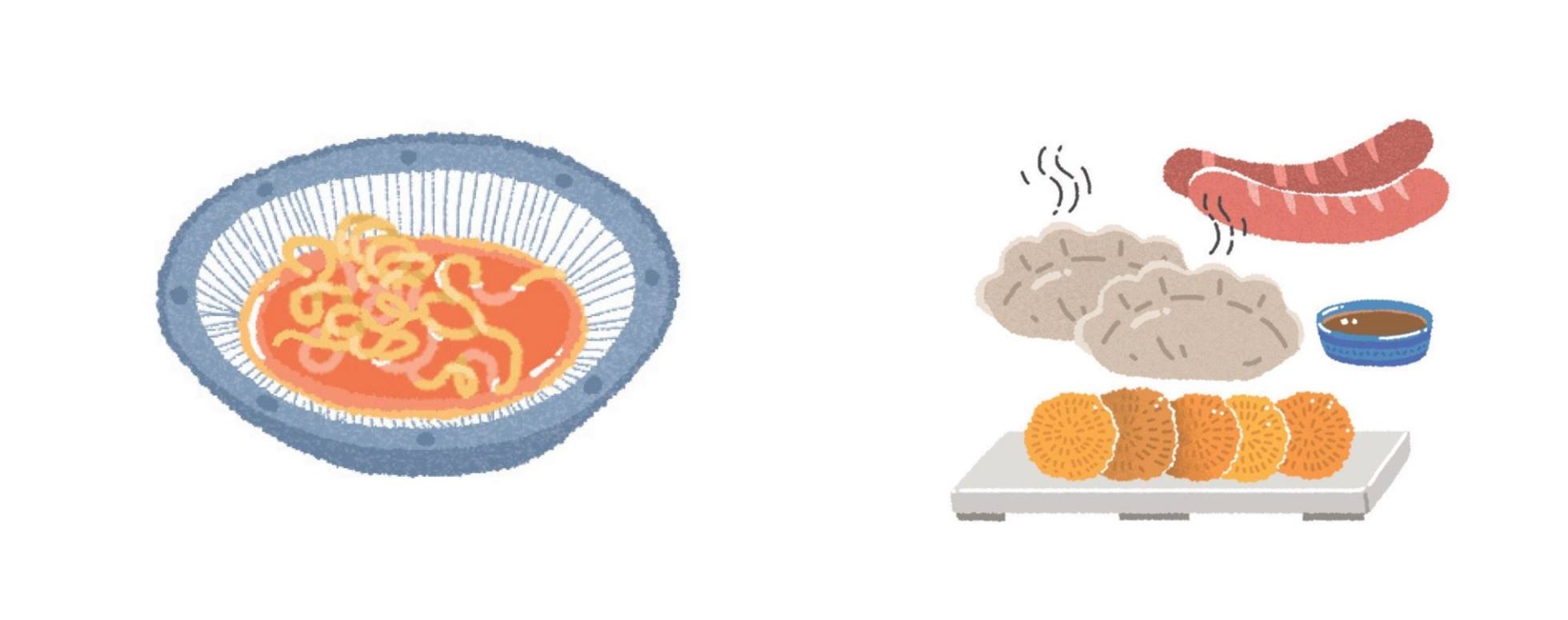
‘민후는 라면을 좋아했지. 내가 혼자 끓여 먹을 때마다 ‘한 입만’ 하면서 졸랐었는데.’
민혁은 동생을 떠올리며 끓는 물에 수프를 털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와 함께 라면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민후야, 이거 먹어 봐.”
민혁은 라면을 작은 접시에 덜어 새 앞에 놓았습니다. 새는 접시를 쳐다보더니 슬쩍 부리를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마음 졸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때, 새가 목을 확 뒤로 뺐습니다. 민혁이 다시 접시를 밀어보았지만, 새는 부리를 홰홰 저었지요. 민혁은 기억을 더듬으며 동생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계속해서 조리해 새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시지, 미니 돈가스, 만두…. 하지만 새는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먹는 건 안 통하네. 그러면…. 물건!”
민혁은 민후의 장난감 상자를 끌고 와 그 안에 든 장난감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너 좋아하던 공룡 모형. 세트로 샀는데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남은 건 이거 하나잖아. 그걸로 내가 엄청 뭐라 했는데. 아, 이 글러브로 아빠랑 캐치볼 많이 했지? 아빠가 없으면 나한테 왔었잖아. 그러고 보니 내가 한 번도 같이 캐치볼 해준 적이 없구나….”
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구슬처럼 동그란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담, 이걸 보여주면 되겠다.”

민혁은 안방으로 달려가 사진첩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곤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새를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 갔던 거 기억 나? 승마 체험장에서 네가 이상한 돌멩이라면서 말똥 주워 왔었잖아. 난 저리 가라면서 막 뭐라고 했지….”
민혁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돌이켜 보니, 민혁은 동생을 귀찮아했을 뿐 제대로 놀아주거나 보살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민혁은 민후의 기억 속에 자신과의 좋은 추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후야, 미안해. 그동안 잘해준 거 하나 없이 귀찮아하기만 해서. 앞으로 잘해줄게. 그러니 제발 돌아와….”
민혁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새는 그런 민혁을 위로하듯 어깨에 올라 얼굴을 볼에 갖다 댔습니다.
#3
어느새 저녁노을이 거실에 드리웠습니다. 차갑게 식은 음식, 널브러진 장난감과 사진들을 죽 둘러본 민혁은 눈물 자국 가득한 얼굴로 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형아, 우리 왔어.”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후 목소리가 나자 민혁은 고개를 번쩍 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후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민혁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 있던 새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민혁아, 무슨 일이야? 울었어?”
“민후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자는 사이에 자기도 가겠다고 하도 졸라서 같이 시골 갔다 왔어. 민후가 없어져서 놀란 거야? 잘됐구나 하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의외인걸?”
아빠의 말에 민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민후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형아, 왜 이래?”
놀라 버둥거리는 민후에게 민혁이 말했습니다.
“민후야, 다음 주에 형이랑 같이 캐치볼 하러 가자.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때 창밖으로 무지개색 깃털의 작은 새가 포드닥 날아올랐습니다. 형제가 포옹하는 모습을 힐끗 바라본 새는 몸을 돌려 노을을 향해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