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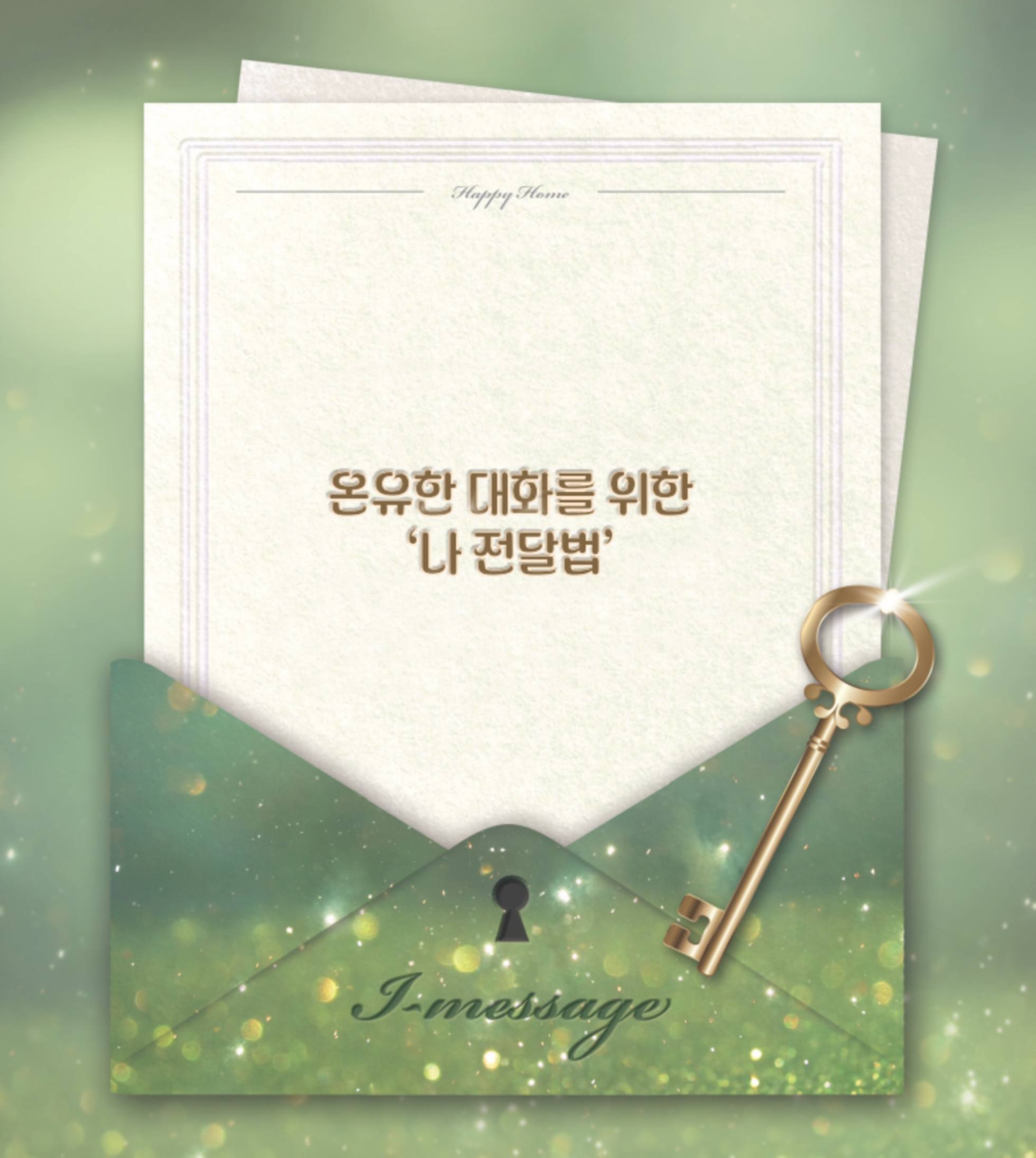
“사용한 컵은 씻어놓으라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맨날 핑계야.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누구에게나 각자의 소신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으레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배우자의 생활 습관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의 행동 등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는 대상이 가족일 때가 많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서슴없이 비난의 말을 내뱉는다는 점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공격하는 말로, 상대방의 성품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불만은 불평이고, 상황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두면 비난이 된다.
부부관계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를 망치는 직접적인 원인은 성격 차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비난’이라며, 비난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삼가야 할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 비단 부부만 아니라 어떤 관계든 비난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상처의 깊이에 따라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비난은 ‘너 전달법’으로 나온다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와 같이, 비난은 ‘너+부정적인 말’로 성립된다. 비난의 공식처럼 상대방을 주어로 말하는 화법을 ‘너 전달법(You-message)’이라 한다. “너는”, “당신은”으로 시작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단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은 있지만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이 되는 문제는 대체로 윤리와 도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이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의 차이로 타인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 정체성을 규정당하면 누구라도 반발심이 생긴다.
더구나 비난과 지적은 ‘맨날, 언제나, 항상, 너무, 한 번도 ~없다’와 같은 일반화를 동반하기 쉬운데,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과장된 표현에 주목해 반기를 들게 된다. 대화가 의도치 않게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
비난과 같은 언어 학대는 외형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학대가 지속되면 단순히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뇌세포를 망가뜨린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틴 교수의 연구 결과, 성장기 때 언어 학대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란 성인들의 뇌는 뇌량과 해마가 위축되어 있었다. 이는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면 행동이 점점 위축되고, 부정적인 평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를 낙인효과(Stigma Effect)라고 한다.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비난받을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처럼 비난은 관계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도록 만든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동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비난의 말 속에는 욕구가 있다
비난은 상대방의 언행에 불쾌감을 느낄 때 자동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불쾌한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자연스레 너 전달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대화를 잘 풀어나가려면 상대방의 언행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비난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확신에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나의 욕구가 내재한다. 불쾌한 감정이 상대로 인해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구로 인해 생겨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아무런 욕구가 없다면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괘념치 않을 터, 비난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의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불쾌한 감정이 들 때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그 불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지, 상대에게 표현할 만한 일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불편을 표현해 상황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상대방 자체가 아닌 상대방의 행동에 있음을 잊지 말고, 비난의 형태가 아닌 바람으로 표현해야 한다.
반대로, 혹 상대가 격분하여 비판과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면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차분히 말해주는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상대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도 있다. 비록 비난이라는 거친 그릇에 담겨 있으나 그 안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찾아내 “당신 말은 이런 뜻이죠?”라며 욕구를 알아주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의 감정도 누그러진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비난하는 대화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바라는 점을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
가까운 만큼 불편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 가족끼리 비난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화하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 갈등의 원인이 표현하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 박사는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로 ‘나 전달법(I-message)’을 제시했다. ‘나’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사용한 컵을 씻어놓지 않으면 내게 설거지를 떠넘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 물 마신 뒤에 바로 씻어놓으면 좋겠어”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상대에 대한 평가, 해석, 질책이 들어가지 않아 상대에게 저항을 덜 유발하고 상처 주지 않으므로 대화가 안전해진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원하는 것 등 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논쟁 대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너’를 주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과 ‘나’를 주어로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말은 천지 차이다. 너 전달법이 상대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말이라면, 나 전달법은 상대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말이다.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도 달라진다.
대화가 다소 격해질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언쟁을 막을 수 있다. “너는”으로 시작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주어부터 “나는”으로 바꾸어보자. 나 전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배려해 원만한 소통에 이르는 것이므로, ‘나’ 뒤에 오는 말도 부드러워야 한다. “나 화났어”, “나 너랑 얘기하기 싫어”와 같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대가 들었을 때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이면 소용없다. 나 전달법을 제대로 알고 시도하다 보면 거친 생각을 가다듬게 되고, 그와 함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는 비난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난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체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난다. 반복하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강화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자신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비난은 말 자체로도 상처가 되지만 발화자가 가족이라면 상처의 깊이는 가중된다. 가족에게 불편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비난을 그만두고 반드시 ‘나 전달법’으로 말하자. ‘너 전달법’은 “당신은 소중해”, “너는 예쁜 마음을 가졌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등과 같이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어에 따라 메시지와 뉘앙스를 달리하는 효과를 이용해, ‘우리’를 주어로 말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뭐 먹을까요?”,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우리’를 주어로 말하면 일체감을 주며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뉘앙스가 전해진다.
중요한 건 말 이면에 있는 마음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전달법’은 결국 상대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연습하는 화법이다. 뾰족한 말을 거두고 온유한 대화를 할 때 내면의 성장점은 좋은 자극을 받는다.
169